문학공모전, 대학 입시, 대기업 공채
이것은 어떤 시스템의 일부다. 입시(入試)가 있는 시스템. 세계는 둘로 나뉘어 있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려면(入) 시험(試)을 쳐야 한다. 시험 한쪽은 지망생들의 세계, 다른 한쪽은 합격자의 세계인 것이다. 문학공모전이 바로 그 시험이다.
대학 입시와 기업의 공채 제도, 각종 고시나 전문직 자격증 시험도 모두 본질적으로 같다.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획일적이고, 지독히 한국적이다. 지원자는 모두 한 시험장에 들어가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친다. 소수의 합격자와 다수의 불합격자가 생긴다. 불합격자들이 좌절로 괴로워하는 동안 합격자들은 불합격자들과 멀어진다. 그들은 합격자들의 세계에서 새로운 규칙을 배운다. 패거리주의, 엘리트주의가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다.
몇몇은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며 울분을 터뜨리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그럭저럭 기능한다고 여긴다. 어쨌거나 그 시스템은 한국 사회에 너무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테두리 밖에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팍팍하다.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게 나을 정도다. 수능을 거부하는 학생운동가보다는 대학에 떨어져 고졸 학력인 사람이 눈총을 덜 산다.
다만 이 '입시-공채 시스템'이 예전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한다. 몇몇은 이 시스템이 거의 한계에 온 것 아닐까 내심 걱정하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된 선발 시험이 이제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험 자체가 부당한 계급사회를 만드는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번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다시는 지망생들의 세계로 떨어지지 않는 경직성이 근본 원인이다.
비판자들은, 합격자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지위를 단단히 하는 데 입시를 악용하고, 그걸 일종의 산업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단의 폐해'라는 것들도, 큰 틀에서 보면 사실 한국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끼리끼리 문화'의 문학계 버전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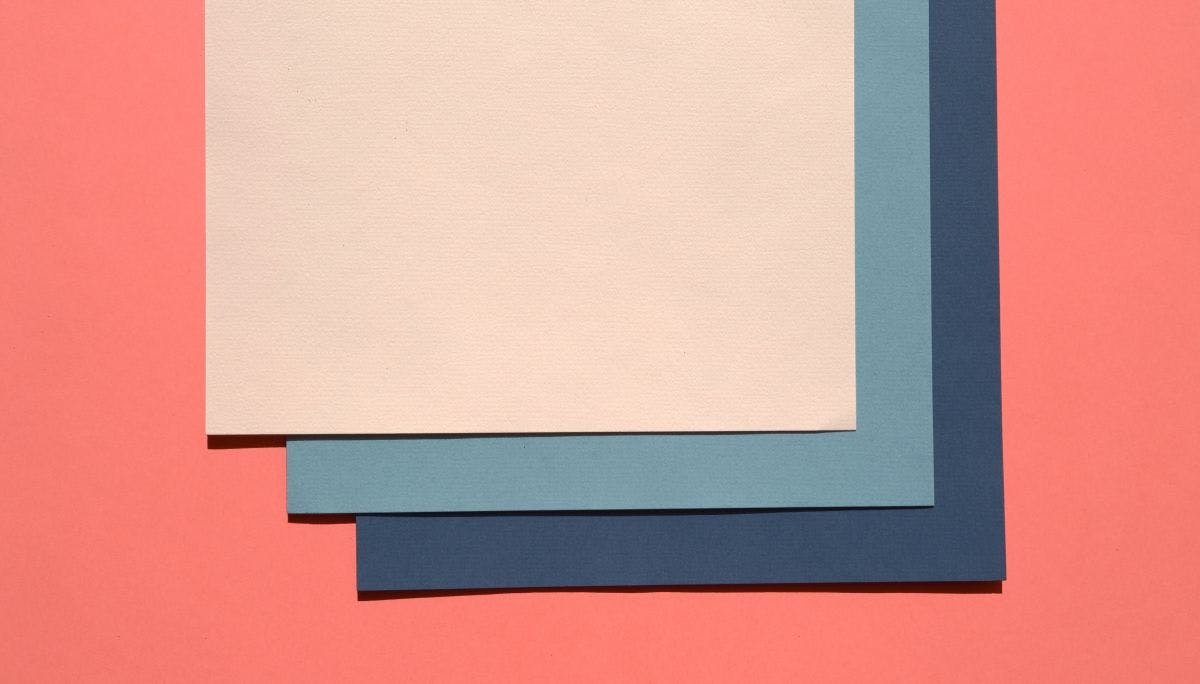

 5분 분량
5분 분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