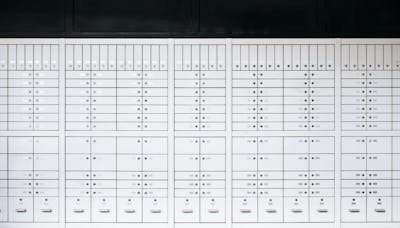시애틀의 헌책방-헌책방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세상 어느 곳에나 헌책방은 있다. 저작권료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출판생태계를 교란한다며 종종 눈칫밥을 먹지만 책이 단지 잘 팔리는 상품으로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읽혀 널리 퍼지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면 헌책방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 헌책방에 관해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구절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일본의 장서가 오카자키 다케시와 작가 가쿠다 미쓰요가 함께 쓴 <아주 오래된 서점>에 나온다.
"헌책방에 진열된 책은 모두 가게 주인이 자기 돈으로 사들인, 반품할 수 없는 상품뿐이다. 더러워지거나 표지가 찢어져 팔리지 않으면 그 손실은 주인이 뒤집어쓴다. 당신이 돈을 내고 자신의 물건으로 만들기 전까지 헌책방 책장에 진열된 책은 모두 헌책방 주인의 재산이자 소유물이다. 주인의 장서라고도 할 수 있다."
헌책방 책이 서점 주인의 장서이기도 하다는 말은 책이 서점 주인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에게 또는 어딘가에서 책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것에서 얼마를 주고 살지, 판매액은 얼마를 책정할지 결정하는 것까지 주인 몫이다. 실내 책장 깊숙이 진열할지, 균일가 야외 판매대에 둘지 모든 단계마다 책방 주인은 책을 들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헌책방의 책이 예사로 느껴지지 않았다. 설사 그 책이 흔하디흔한 한때의 베스트셀러였다고 해도 말이다.
시애틀에도 헌책방이 여럿 있다. 독립 서점을 다니는 김에 헌책방도 함께 돌아보았다. 대부분의 헌책방은 대학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매출 하락과 함께 존재 가치를 의심받고 있는 책이 누구에게 가장 긴요한 소비재인지 알 듯했다. 가장 인상적인 서점은 오필리아 북스(Ophelia's Books)였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계산대에 갇힌 듯 앉아 있던 중년의 주인은 긴 머리를 자연스레 풀어헤치고 샌드위치를 먹는 중이었다. 아침 일찍 서두르느라 아침을 거른 모양이었다. 사람이 들고 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책을 뒤적이며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서 어쩐지 나른해 보였다.


 5분 분량
5분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