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아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고민하고 떠올렸던 생각들을 묶어 작품을 만든다. 29CM의 〈초이스 매거진〉에 최근까지 연재했던 ‘나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김홍구와 공동 운영 중인 작은 출판 스튜디오 ‘우주만화’의 작업물 등에서도 꾸준히 드러나는 그의 정서다. 임진아의 그림은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만큼의 우주가 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처음 시작했나.
임진아: 스물둘에 문구회사에 취직했다. 아기자기한 그림들로 스탬프를 만드는 게 첫 작업이었다. 원래 문구 쪽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어머니가 광화문에서 카페를 하셨기 때문에 고등학생 시절 매주 토요일마다 교보문고에 갔다. 거기서 핫트랙스를 구경하는 게 일이었다. 0-check이나 mmmg 같은 브랜드를 알게 되면서 나도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된 회사였나.
임진아: 대표가 두 명이었는데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다 보니 나에 대해서도 직원 대우를 해준다기보다는 본인들처럼 언제 퇴근해도 괜찮겠지, 하는 식으로 일했다. 11시에 출근하다 보니 어쨌든 6시에는 절대 집에 가지 못하는 거다.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좋아하는 공연이 있어서 예매를 해놨는데 가도 되냐고 했더니 정색을 하더라. 출근 시간이 늦은 대신 퇴근 시간이 없던 게 그때는 좀 힘들었다. 그래도 다른 일반 회사들보다 분위기는 자유로웠던 것 같다. 11시에 출근해서 밥 먹으러 한강에 도시락을 들고 나갔다가 2, 3시에 들어오고, 밤늦게 퇴근하고. 회사라기보다는 같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모인 느낌이었다.
트러블은 없었나.
임진아: 나 혼자 느끼는 건 있었지만 그걸 말하지는 않았지. 공간을 같이 쓰는 대표 언니가 예민하다 보니 힘들 때가 있었다. 대표들끼리 싸우고 나면 언니가 들어와서 책상을 다 엎어버린다든가 하는 걸 보게 되니까. 또 그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 자기만의 공간에 내가 들어간 거고. 당시 우울증이라는 게 처음으로 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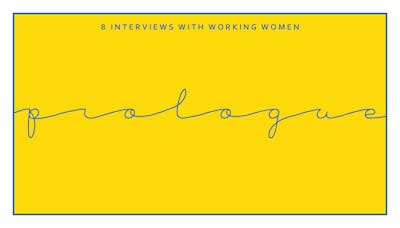
 2분 분량
2분 분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