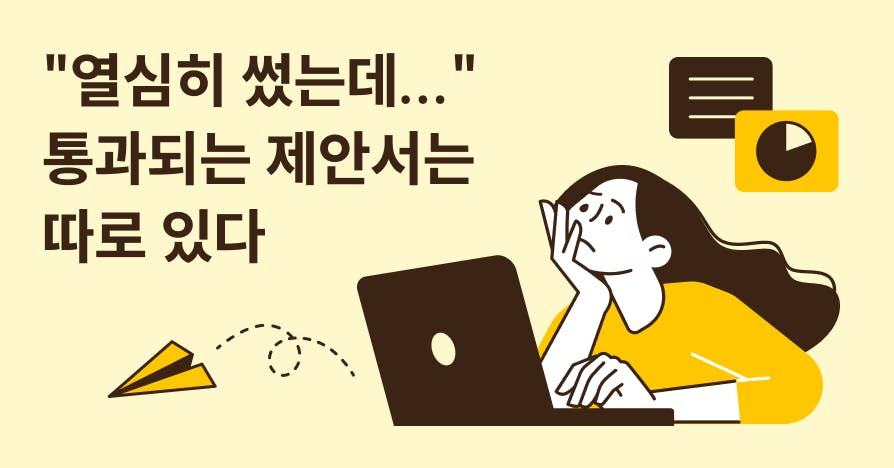그 제안서, 처음부터 명쾌했더라면
💡 10분 안에 이런 걸 알려드려요!
- 거절당하는 제안서와 승인받는 제안서의 결정적 차이를 알려줘요.
- 내용이 명확할수록 승인율이 높겠죠? 작성 구체화 과정을 알려줘요.
-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시각화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줘요.
저자 량과장
니어사이드 대표 > 프로필 더 보기
몇 날 며칠 공들여 작성한 제안서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작성자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시장 분석부터 실행 계획까지 빠뜨린 것 하나 없이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요약 요청, 재작성 요청을 받기라도 하면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할지 막막해 눈앞이 깜깜해지기 마련이다.
열심히 작성했는데 상사로부터 보류 또는 반려당한 제안서를 살려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 작성한 제안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일 아침 9시, 내 상사의 책상 위에 12개의 결재 문서가 쌓이고 모든 결재가 오후 6시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상사에게 제안서 전체를 읽을 시간이 있을까? 없을 것이다.
대다수의 결재권자들은 제안서의 도입부에서, 과장을 조금 보태 첫 10초 안에 승인할지, 보류할지 혹은 휴지통으로 보낼지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내 상사가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부 제안서와 외부 제안서는 '이렇게' 달라요!
회사 내부에서 제안서를 작성할 때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있다. 바로 내부 제안서에 외부 제안서의 플로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면 승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제안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외부 제안서의 포커스가 '설득'에 있다면, 내부 제안서의 핵심은 '승인'에 있다. 결재권자는 내부 제안서를 살펴볼 때 중요성을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
제안서를 받아든 결재권자들의 머릿속에는 몇 가지 질문들이 떠오른다.
"이 일이 지금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승인해도 리스크는 없을까?"
도입부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면 제안에 성공하기는 어렵다.
1️⃣ 결재권자의 뇌는 'Quick 모드'로 작동한다
수많은 문서를 하루에 처리하려다 보면 제안서를 필터링할 수밖에 없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안전성'인데, 비용 부담, 실행 가능성, 승인 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전하지 않은 제안이라는 판단이 서면 결재권자는 제안을 반려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