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에 대해 나만의 뚜렷한 관점을 갖고 있다거나, 그의 문학 세계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쓴 작품에 조예가 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키의 작품에 익숙한 애독자들과 그의 문학에 문외한인 나와 같은 사람들 모두에게 이 책을 조심스럽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
이 책은 그가 본격적인 소설가로 살아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1982년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로 성장하는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작품 활동과 함께 지속해 온 '달리기라는 행위를 축으로' 쓴 최초이자 아마도 최후가 될 유일한 회고록이다. 하루키는 소설, 글쓰기와 재능, 인간의 육체와 나이 듦에 대해서 다소 건조한 어조로 이야기를 이어 가지만, 탁월하고 위트 넘치는 비유 덕분에 글이 결코 냉랭하거나 우울한 정서에 빠지는 법이 없다. 인생에 대한 관조와 같은 그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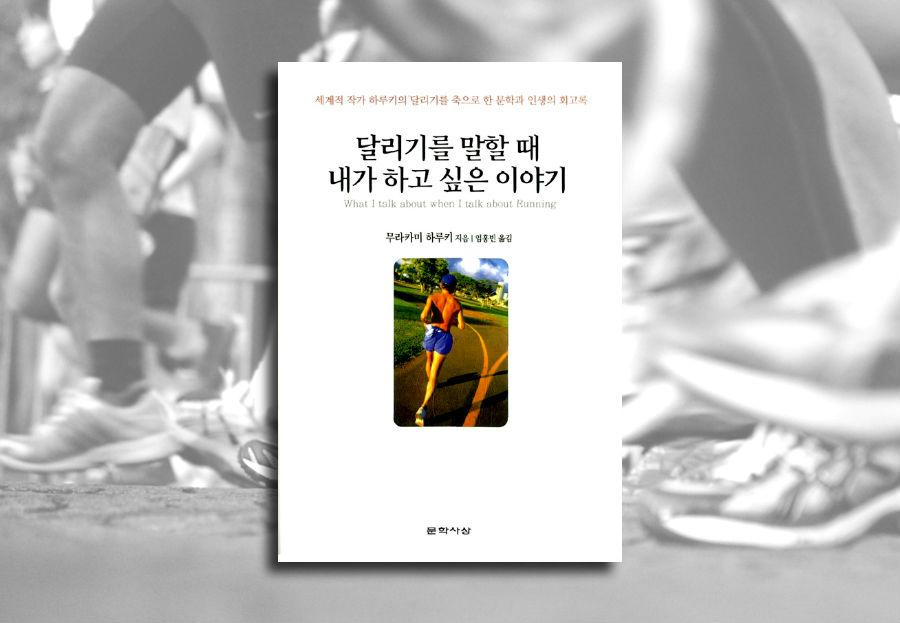
하루키는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두뇌 노동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장편소설과 같이 "한 권의 정리된 책을 완성하는 일은 육체 노동에 가깝다"고 말한다. 또한 작가란 "인간 존재의 근본에 있는 독소"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위험을 인지해서 솜씨 좋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적이든 비유적 의미에서든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소설가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그는 두말 할 것 없이 문학적 재능이라고 꼽으면서도, 재능은 "그 양과 질을 소유자가 잘 제어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거장이 될 정도로 풍부한 재능을 보유하지 못한 세상 대부분의 작가들은(하루키는 자신을 여기에 포함시킨다) "많든 적든 재능의 절대량의 부족분을 각자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여러 측면에서 보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겸손하게 고백한다.
그는 소설 쓰기의 많은 것을 매일 아침 길 위를 달리면서 육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배워 왔다고 말한다. 그는 장거리를 달릴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육체를 들여다본다. "우리의 의식이 미로인 것처럼 또 하나의 미로인" 몸과 대화하는 가장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방법이다.
하루키의 20년 넘게 달리는 행위에서 적어도 나에게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온 부분은 "그것이 실제로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린 낡은 냄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허망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노력을 했다는 사실은" 남으며, "살아 있는 동안은 온전한 인생을 보내고" 싶고,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위는 아닐 것"이라는 땀이 배어 있는 메시지였다. 그러면 나도 나이가 든다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실을 "요절을 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전"으로 받아들이고, 육체의 감퇴를 비극이기보다는 영예로 인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에게 주는 기대하지 않은, 혹은 의외의 결과는 나도 달려보고 싶다는 강한 동기를 형성해 준다는 것이다. 본인도 이 책을 다 읽은 지난 봄부터 느닷없이 달리기 시작해서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를 대비한 러닝 슈트 장만을 진지하게 고려할 정도로 달리기를 즐기게 되었고, 이제는 오래 거르면 불안한 습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러너가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