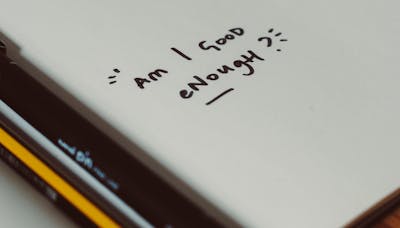구글과 함께 성장한 나
첫 출근은 합격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바로 이루어졌다. 갑자기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급격하게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덕분에 같이 진행 중이던 다른 회사 면접도 전부 중단해야 했다.
내가 가진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에겐 구글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다. 첫 출근을 하던 날 아침, 회사 로비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 동안이나 오가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세계 최고의 회사.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가장 혁신적인 회사.
이런 화려한 문구들로 소개되었던 구글의 첫 인상은 조금 독특하고 새로웠다. 당시 구글코리아에는 공채가 없었던 탓에 각 팀별로 필요한 팀원을 뽑았는데, 그날 입사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나밖에 없었다. 신입사원 연수라는 게 있을 리가 없었고 입사 동기도 없었다.
그냥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회사로 가라는 외국인 채용담당자의 이메일 하나가 전부였다. 아침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기…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입사원인데요…'라고 프런트데스크에 말하는 것이 정규직 사원으로서 첫마디였다.
구글에서는 많은 것이 매우 자율적이었다. 일례로 입사 후 인도의 하이데라바드(Hyderabad)로 열흘 정도 트레이닝을 받으러 가게 되었는데, 신입사원인 나를 혼자 보내버릴 정도였다. 내가 아는 거라곤 인도 담당자 이메일 주소와 트레이닝 일정, 그리고 하이데라바드 오피스 주소뿐이었다.
비자, 비행기 티켓, 숙소도 모두 직접 처리해야 했고 심지어 인도의 공항에서 회사 주소 하나만 달랑 들고 혼자 찾아가야 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매우 익숙해졌지만 그때는 너무 자율적인 나머지 도리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것 같은 당혹감이 들었다.


 5분 분량
5분 분량